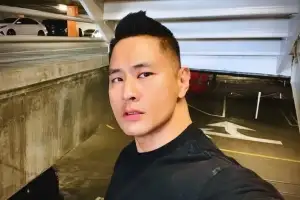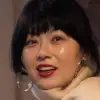브레이어·긴즈버그 대법관 “사형제 위헌 여부 검토할 때”
대법관으로선 1994년 이후 첫 주장…”사형수 100여명 무죄로 석방”미국의 사형제도가 불쑥 도마 위에 올랐다.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던 와중에 사법부 내에서 “사형제 폐지를 검토할 때”라는 목소리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당국이 독극물 주사 방식을 통한 사형 집행 때 수술용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쓰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 당국은 사형수의 몸에 가장 먼저 마취제를 투여하고 나서 신체를 마비시키는 약물을 주입하고 마지막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넣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 마취제로 쓰이는 미다졸람의 약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던 끝에 대법원이 이날 논란을 종결지었다.
소송은 오클라호마 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리처드 글로십, 존 그랜트, 벤저민 콜 등 세 사형수가 올해초 미다졸람을 이용한 사형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9세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클레이튼 로킷의 사형 집행에 사용됐던 미다졸람이 제대로 마취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처음에 의식을 잃은 듯했던 로킷은 잠시 후 몸부림을 치다 깨어났고 40여 분이 지난 후 약물이 아닌 심장마비로 숨졌다.
그러자 소송을 제기한 세 사형수는 미다졸람의 약효가 강력하지 않아 사형 집행 때 고통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다수 의견을 주도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청구인들은 미다졸람이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의 정도가 실질적이었는가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미다졸람의 약효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사형제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날 심리과정에서 스티븐 브레이어·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법관 진용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와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과거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시작할 시점”이라며 “사형제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1976년 사형제 부활과 연계된 사법적 보호장치가 실패했다”며 “최근 수십 년간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무죄로 석방됐고 일부 무고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형집행이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가 사형집행을 포기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단 7개 주만이 사형을 집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는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 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그러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사형수로 30년간 복역하다가 지난해 유전자(DNA) 검사에 따라 무죄로 풀려난 헨리 리 매콜룸의 사례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29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3월 풀려난 흑인 글렌 포드(65)도 이날 뉴올리언즈의 자택에서 암으로 사망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포드는 1983년 보석상인 이사도르 로즈먼(56)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 판결을 받고 과거 노예농장으로 쓰였던 뉴올리언즈 앙골라감옥에서 복역해왔다.
긴즈버그 대법관도 같은 의견을 표시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지금까지 역대 대법관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윌리엄 브레넌(1956∼1990)과 더굳 마샬(1967∼1991), 그리고 브레이어 대법관의 전임으로 1994년 은퇴한 해리 블랙먼(1970∼1994)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2년 사형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했다가 1976년 부활시켰지만, 현재 32개 주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D.C.를 포함한 18개 주는 자발적으로 사형 집행을 포기한 상태이다.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주들은 과거에 주로 쓰이던 총살형이나 전기의자형 대신 독극물에 의한 주사 방식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의 제약사들이 사형집행용 약물 생산과 공급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초 마취제로 사용되던 티오펜탈과 펜토바르비탈을 만들던 제조사들이 이 약물이 사형집행에 쓰이는 것을 알고는 공급을 기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다졸람처럼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술용 마취제가 대신 사형집행에 사용된 것이다.
사형집행용 약물이 부족해지자 일부 주들은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까지 ‘부활’시키고 있다. 유타 주는 지난 3월 야만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총살형까지 허용했고 그 다음 달 오클라호마 주는 니트로겐 가스를 이용한 사형을 승인했다.
그러나 유엔을 무대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다가, 미국 대법원 내에서까지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형제 존치 여부를 둘러싼 미국 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2009년 52차례에 달했지만 계속 줄어 지난해 35차례만 실시됐고 올해는 6월 말 현재 17차례 집행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말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