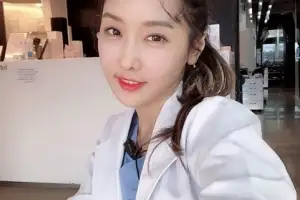мӮ¬нҡҢм Ғ м•Ҫмһҗ н’ҲлҠ” вҖҳм„ұм§ҖвҖҷ м—ӯн• вҖҰвҖқмҲҳл°°мһҗк°Җ мў…көҗ мқҙмҡ©вҖқ 비нҢҗлҸ„
мЎ°кі„мӮ¬к°Җ м§ҖлӮңлӢ¬ 16мқј кІҪм°°мқ„ н”јн•ҙ л“Өм–ҙмҳЁ н•ңмғҒк· лҜјмЈјл…ёмҙқ мң„мӣҗмһҘмқ„ 24мқјк°„ ліҙнҳён•ң мқҙмң лҠ” вҖҳмҶҢлҸ„вҖҷ(иҳҮеЎ—)лЎңм„ңмқҳ м—ӯн• мқ„ мҲҳн–үн•ң кІғмңјлЎң ліј мҲҳ мһҲлӢӨ.мҶҢлҸ„лһҖ мӮјн•ң мӢңлҢҖ мІңмӢ м—җкІҢ м ңмӮ¬лҘј м§ҖлӮҙлҚҳ м„ұм§ҖлҘј мқҙлҘҙлҠ” л§җмқёлҚ° мЈ„мқёмқҙ мқҙкіімңјлЎң лҸ„л§қмҳӨл©ҙ мһЎм•„к°Җм§Җ лӘ»н–ҲлӢӨкі н•ңлӢӨ.
мқҙлҹ° л°°кІҪм—җм„ң мҡ°лҰ¬лӮҳлқјм—җм„ңлҠ” 비лЎқ лІ”лІ•мһҗлқјкі н•ҳлҚ”лқјлҸ„ мў…көҗмӢңм„ӨлЎң н”јмӢ н•ҳл©ҙ лӮҙм«“м§Җ м•Ҡкі , кіөк¶Ңл Ҙ м—ӯмӢң н•ҙлӢ№ мў…көҗлӢЁмІҙмқҳ н—ҲлқҪ м—Ҷмқҙ л“Өм–ҙмҷҖ мІҙнҸ¬н•ҳм§Җ м•ҠлҠ” кІғмқҙ м–ҙлҠҗ м •лҸ„ мҡ©мқёлҗң вҖҳл¶Ҳл¬ёмңЁвҖҷлЎң мһ‘мҡ©н•ҙмҷ”лӢӨ.
мў…көҗмӢңм„Өмқҳ мҶҢлҸ„ м—ӯн• мқҙ к°ҖмһҘ л‘җл“ңлҹ¬м§„ мӢңкё°лҠ” н•ҷмғқмҡҙлҸҷмқҙ н•ңм°ҪмқҙлҚҳ 1970вҲј1980л…„лҢҖмҳҖлӢӨ.
лӢ№мӢң мЈјлҗң н”јмӢ мІҳлҠ” м„ңмҡё мӨ‘кө¬мқҳ лӘ…лҸҷм„ұлӢ№мқҙм—ҲлӢӨ.
лӢ№мӢң лӘ…лҸҷм„ұлӢ№мқҖ н•ҷмғқмҡҙлҸҷмқ„ н•ҳлҠ” н•ҷмғқл“Өмқ„ 비лЎҜн•ҙ мӢңкөӯмӮ¬лІ”л“Өмқҙ кІҪм°°м—җ м«“кёё л•Ң м°ҫлҠ” вҖҳмөңнӣ„мқҳ ліҙлЈЁвҖҷ к°ҷмқҖ кіімқҙм—Ҳкі , 1990л…„лҢҖ л“Өм–ҙм„ңлҠ” нҒ¬кі мһ‘мқҖ л…ёлҸҷмЎ°н•©мқҳ лҶҚм„ұмһҘмҶҢлЎң м“°мҳҖлӢӨ.
1990л…„ 1мӣ” м „көӯл…ём җмғҒнҳ‘нҡҢ 50м—¬лӘ…мқҙ лӘ…лҸҷм„ұлӢ№м—җм„ң к·ңнғ„лҢҖнҡҢлҘј м—ҙм—Ҳкі , к°ҷмқҖ н•ҙ 3мӣ”м—җлҠ” м „көӯкөҗм§Ғмӣҗл…ёлҸҷмЎ°н•© кІҪкё°м§Җл¶Җ мҶҢмҶҚ н•ҙм§ҒкөҗмӮ¬ 40м—¬лӘ…, 4мӣ”м—җлҠ” м „көӯл…ёлҸҷмЎ°н•©нҳ‘мқҳнҡҢ к°„л¶Җ 150м—¬лӘ…мқҙ лӢЁмӢқлҶҚм„ұмқ„ лІҢмқҙлҠ” л“ұ л§ӨлӢ¬ лҶҚм„ұмқҙ лҒҠмқҙм§Җ м•Ҡм•ҳлӢӨ.
к·ёлҹ¬лӮҳ мһҰмқҖ лҶҚм„ұкіј мһҘкё° н”јмӢ мңјлЎң мӢ мһҗл“Өмқҙ л¶ҲнҺёмқ„ кІӘкІҢ лҗҳмһҗ лӘ…лҸҷм„ұлӢ№мқҖ м җм°Ё лҶҚм„ұм—җ л¶ҲнҺён•ң мӢ¬кІҪмқ„ л“ңлҹ¬лғҲкі , 2001л…„м—җлҠ” 20м—¬мқј к°„ мІңл§үлҶҚм„ұмқ„ лІҢмқҙлҚҳ лҜјмЈјл…ёмҙқ лӢЁлі‘нҳё м „ мң„мӣҗмһҘм—җкІҢ нҮҙкұ°мҡ”мІӯ кіөл¬ёмқ„ ліҙлӮҙкё°лҸ„ н–ҲлӢӨ.
лҜјмЈјнҷ” нҲ¬мҹҒмқҙлқјлҠ” лӘ…분мқҙ мӮ¬лқјм§„л§ҢнҒј лҚ”мқҙмғҒ лӘ…лҸҷм„ұлӢ№мқҙ мқҙн•ҙкҙҖкі„м—җ м–ҪнһҢ мқҙл“Өмқҳ нҲ¬мҹҒкіј лҶҚм„ұмһҘмңјлЎң м“°мқј мҲҳлҠ” м—ҶлӢӨлҠ” мқҳлҜёк°Җ лӢҙкёҙ мЎ°м№ҳмҳҖлӢӨ.
лӘ…лҸҷм„ұлӢ№мқҙ лҚ”лҠ” л…ёмЎ°мқҳ лҶҚм„ұмқҙлӮҳ мҲҳл°°мһҗмқҳ н”јмӢ мқ„ мҡ©мқён•ҳм§Җ м•Ҡмңјл©ҙм„ң лҢҖм•ҲмңјлЎң л– мҳӨлҘё кіімқҙ мЎ°кі„мӮ¬лӢӨ.
2008л…„м—җлҠ” лҜёкөӯмӮ° мҮ кі кё° мҲҳмһ… мһ¬нҳ‘мғҒ мҙүкө¬ мҙӣл¶Ҳ집нҡҢмҷҖ кҙҖл Ён•ҙ вҖҳ집нҡҢ л°Ҹ мӢңмң„м—җ кҙҖн•ң лІ•лҘ вҖҷ мң„л°ҳ нҳҗмқҳлЎң мҲҳл°°лҗң вҖҳкҙ‘мҡ°лі‘ көӯлҜјлҢҖмұ…нҡҢмқҳвҖҷ к°„л¶ҖмҷҖ мқҙм„қн–ү м „ лҜјмЈјл…ёмҙқ мң„мӣҗмһҘ л“ұ 6лӘ…мқҙ мЎ°кі„мӮ¬м—җ лӘёмқ„ мҲЁкІјлӢӨ.
2013л…„ 12мӣ”м—җлҠ” мІ лҸ„нҢҢм—…мқ„ мЈјлҸ„н•ң нҳҗмқҳлЎң мҲҳл°°лҗң л°•нғңл§Ң лӢ№мӢң мІ лҸ„л…ёмЎ° мҲҳм„қ л¶Җмң„мӣҗмһҘмқҙ мЎ°кі„мӮ¬лЎң мқҖмӢ н–ҲлӢӨ.
к·ёлҰ¬кі м§ҖлӮң 11мӣ” 16мқј н•ң мң„мӣҗмһҘмқҙ кІҪм°° мІҙнҸ¬лҘј н”јн•ҙ мЎ°кі„мӮ¬лЎң л“Өм–ҙк°”лӢӨ.
мЎ°кі„мў… нҷ”мҹҒмң„мӣҗнҡҢ мң„мӣҗмһҘмқё лҸ„лІ•мҠӨлӢҳмқҖ м§ҖлӮңлӢ¬ 19мқј вҖңн•ң мң„мӣҗмһҘмқҙ мЎ°кі„мӮ¬м—җ л“Өм–ҙмҳЁ кІғкіј кҙҖл Ён•ҙ м—„кІ©н•ң лІ• 집н–үмқҙ н•„мҡ”н•ҳлӢӨлҠ” мқҳкІ¬, мў…көҗлӢЁмІҙлЎңм„ң мһҗ비н–үмқ„ нҸ¬кё°н•ҙм„ңлҠ” м•Ҳ лҗңлӢӨлҠ” мқҳкІ¬, лӘЁл‘җ к°ҖлІјмқҙ м—¬кёё мҲҳ м—ҶлҠ” кІғл“ӨвҖқмқҙлқјл©ҙм„ңлҸ„ мӢ ліҖліҙнҳём—җ лҢҖн•ҙм„ңлҠ” вҖңмқҙлҜё н•ҳкі мһҲлҠ” мғҒнғңвҖқлқјкі м „н•ҳкё°лҸ„ н–ҲлӢӨ.
к·ёлҹ¬лӮҳ мқјк°Ғм—җм„ңлҠ” м •көҗ분лҰ¬к°Җ м •м°©лҗң нҳ„лҢҖмӮ¬нҡҢм—җм„ң мў…көҗлӢЁмІҙк°Җ мҶҢлҸ„ м—ӯн• мқ„ н•ҳлҠ” кІғмқҙ м Ғм Ҳн•ҳлғҗлҠ” м§Җм ҒлҸ„ лӮҳмҳЁлӢӨ.
кіјкұ° мў…көҗмӢңм„ӨлЎң н”јмӢ н•ҙмҳЁ мқҙл“ӨмқҖ к¶Ңмң„мЈјмқҳ м •л¶Җ мӢңм Ҳ лҜјмЈјнҷ”лҘј мң„н•ҙ нҲ¬мҹҒн•ң мқҙл“Өмқҙм—Ҳм§Җл§Ң, м§ҖкёҲмқҖ лҜјмЈјнҷ”к°Җ мқҙлЈЁм–ҙм§Җкі м§‘нҡҢлӮҳ мӢңмң„лҸ„ лІ•м—җ мқҳн•ҙ мғҒлӢ№л¶Җ분 ліҙмһҘлҗң мғҒнғңкё° л•Ңл¬ём—җ к·ё мқҳлҜёк°Җ л§Һмқҙ лӢӨлҘҙ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лҸ„лҰ¬м–ҙ кІҪм°°мқҳ м •лӢ№н•ң кіөк¶Ңл Ҙ н–үмӮ¬лҘј мў…көҗлӢЁмІҙк°Җ л°©н•ҙн•ҳкі мһҲлӢӨлҠ” 비нҢҗмқҙ л§Һмқҙ лӮҳмҳӨлҠ” мғҒнҷ©мқҙлӢӨ.
м—¬лЎ мЎ°мӮ¬ м „л¬ёкё°кҙҖ лҰ¬м–јлҜён„°к°Җ м „көӯ 19м„ё мқҙмғҒ м„ұмқё 500лӘ…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мЎ°кі„мӮ¬м—җ лҸ„н”ј мӨ‘мқё н•ң мң„мӣҗмһҘм—җ лҢҖн•ң мІҙнҸ¬мҳҒмһҘ 집н–үмқҳ м°¬л°ҳмқ„ л¬јмқҖ кІ°кіј 52.9%к°Җ вҖҳм°¬м„ұн•ңлӢӨвҖҷкі л°қнҳ”лӢӨ.
вҖҳл°ҳлҢҖн•ңлӢӨвҖҷлҠ” 32.9%, вҖҳмһҳ лӘЁлҰ„вҖҷмқҖ 14.2%лЎң 집계лҗҗлӢӨ. мқҙ м„Өл¬ёмқҳ н‘ңліёмҳӨм°ЁлҠ” 95% мӢ лў°мҲҳмӨҖм—җм„ң Вұ4.4%нҸ¬мқёнҠёлӢӨ.
мӢ лҸ„л“Ө лӮҙм—җм„ңлҸ„ мў…көҗмӢңм„Өмқҳ мҶҢлҸ„ м—ӯн• м—җ лҢҖн•ң л¶Җм •м Ғ мқҳкІ¬мқҙ м Ғм§Җ м•ҠлӢӨ.
мӢӨм ңлЎң н•ң мң„мӣҗмһҘмқҙ мһҗ진 нҮҙкұ°н•ҳкІҢ лҗң лҚ°лҠ” мЎ°кі„мӮ¬ мӢ лҸ„нҡҢмқҳ мҡ”кө¬к°Җ кұ°м…ҢлҚҳ кІғлҸ„ н•ңлӘ«н–ҲлӢӨ.
мЎ°кі„мӮ¬ мқјл¶Җ мӢ лҸ„л“ӨмқҖ м§ҖлӮң 8мқј н•ң мң„мӣҗмһҘмқҳ мқҖмӢ мІҳлҘј м°ҫм•„к°Җ лӘёмӢёмӣҖмқ„ лІҢмқҙл©° н•ң мң„мӣҗмһҘмқ„ мӮ¬м°° л°–мңјлЎң лҒҢм–ҙлӮҙл ӨлӢӨк°Җ к·ёк°Җ кІ©л ¬н•ҳкІҢ м Җн•ӯн•ҳлҠ” л°”лһҢм—җ мӢӨнҢЁн–ҲлӢӨ.
н•ң мӢ лҸ„лҠ” вҖңмқјл¶Җ мҲҳл°°мһҗлҠ” м•ҪмһҗлҘј лӮҙм№ҳм§Җ лӘ»н•ҳлҠ” мў…көҗмқҳ нҠ№м„ұмқ„ мқҙмҡ©н•ҙ л“Өм–ҙмҳӨлҠ” кІғ к°ҷлӢӨвҖқл©° вҖңм•һмңјлЎң лҳҗ мқҙлҹ° л¬ём ңк°Җ л°ңмғқн•ңлӢӨл©ҙ м–ҙл–»кІҢ н• м§Җ л…јмқҳк°Җ н•„мҡ”н•ҳлӢӨвҖқкі л§җн–ҲлӢӨ.
м—°н•©лүҙмҠӨ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