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үліө, кІҪм ңн•ҷмқҳ нҳҒлӘ…/лёҢлЈЁл…ё S н”„лқјмқҙ м§ҖмқҢ/мң м •мӢқ л“ұ мҳ®к№Җ/л¶ҖнӮӨ/376мӘҪ/1л§Ң 8000мӣ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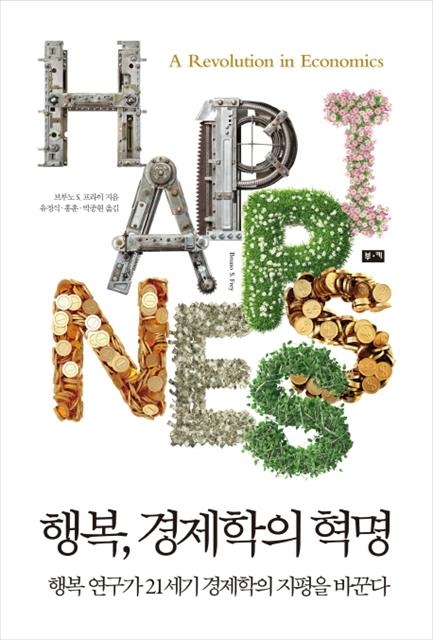
![]() м „нҶөм Ғмқё кІҪм ңмқҙлЎ м—җм„ңлҠ” мӮ¬лһҢл“Өмқҙ кІҪм ңм Ғ н–үлҸҷмқ„ 추лҸҷн•ҳлҠ” мЈјлҗң мҡ”мқёмңјлЎң вҖҳнҡЁмҡ©вҖҷ к°ңл…җмқ„ м Ғмҡ©н•ҙ мҷ”лӢӨ. кІҪм ңнҷңлҸҷмқҳ к¶Ғк·№м Ғ лӘ©м ҒмқҖ мҶҢл“қкіј мҶҢ비лҘј нҶөн•ҙ л§ҢмЎұк°җмқ„ м–»лҠ” кІғмқҙлқјкі ліҙкі , мқҙлҘј нҡЁмҡ©мңјлЎң м„ӨлӘ…н•ң кІғмқҙлӢӨ. н•ңлҚ° л¬ём ңк°Җ мһҲлӢӨ. нҡЁмҡ©мқ„ мёЎм •н•ҙ кі„лҹүнҷ”н• мҲҳ м—Ҷ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мқҙлҠ” м—¬лҹ¬ кІҪм ң м •мұ…л“Өмқ„ мҲҳлҰҪн•ҳкі кІ°мӢӨмқ„ м–»лҠ” лҚ° мһҘм• л¬јлЎң мһ‘мҡ©н•ңлӢӨ.
м „нҶөм Ғмқё кІҪм ңмқҙлЎ м—җм„ңлҠ” мӮ¬лһҢл“Өмқҙ кІҪм ңм Ғ н–үлҸҷмқ„ 추лҸҷн•ҳлҠ” мЈјлҗң мҡ”мқёмңјлЎң вҖҳнҡЁмҡ©вҖҷ к°ңл…җмқ„ м Ғмҡ©н•ҙ мҷ”лӢӨ. кІҪм ңнҷңлҸҷмқҳ к¶Ғк·№м Ғ лӘ©м ҒмқҖ мҶҢл“қкіј мҶҢ비лҘј нҶөн•ҙ л§ҢмЎұк°җмқ„ м–»лҠ” кІғмқҙлқјкі ліҙкі , мқҙлҘј нҡЁмҡ©мңјлЎң м„ӨлӘ…н•ң кІғмқҙлӢӨ. н•ңлҚ° л¬ём ңк°Җ мһҲлӢӨ. нҡЁмҡ©мқ„ мёЎм •н•ҙ кі„лҹүнҷ”н• мҲҳ м—Ҷ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мқҙлҠ” м—¬лҹ¬ кІҪм ң м •мұ…л“Өмқ„ мҲҳлҰҪн•ҳкі кІ°мӢӨмқ„ м–»лҠ” лҚ° мһҘм• л¬јлЎң мһ‘мҡ©н•ңлӢӨ.
мҳҲлҘј л“Өмһҗ. лҲ„кө¬л“ мһҗмӢ мқҙ кё°лҢҖн–ҲлҚҳ кІғліҙлӢӨ лҸҲмқ„ лҚ” лІҢм–ҙл“ӨмқёлӢӨ н•ҙлҸ„ кёҲм„ё н•ҙлӢ№ мҶҢл“қ мҲҳмӨҖм—җ м Ғмқ‘н•ңлӢӨ. лҶ’мқҖ мҶҢл“қм—җ л”°лҘё нҡЁмҡ©к°җ лҳҗн•ң мӢңк°„мқҙ м§ҖлӮҳл©ҙм„ң м җм°Ё мӨ„кІҢ лҗңлӢӨ. мқҙлҘј вҖҳмқҙмҠӨн„ёлҰ° м—ӯм„ӨвҖҷ нҳ№мқҖ вҖҳн–үліөмқҳ м—ӯм„ӨвҖҷмқҙлқјкі л¶ҖлҘёлӢӨ. лҜёкөӯмқҳ кІҪмҡ° 1946л…„кіј 1991л…„ мӮ¬мқҙм—җ 1мқёлӢ№ мӢӨм§ҲмҶҢл“қмқҙ 2.5л°° мҰқк°Җн–ҲлҠ”лҚ° к°ҷмқҖ кё°к°„ лҸҷм•Ҳ н–үліө мҲҳмӨҖмқҖ нҸүк· м ҒмңјлЎң кұ°мқҳ мқјм •н–ҲлӢӨ. мқҙлҠ” кІ°лЎ лҸ„м¶ңмқ„ мң„н•ҙ н•ӯмғҒм„ұ, мҳҲмёЎ к°ҖлҠҘм„ұ л“ұ кіјн•ҷм Ғ 분м„қнӢҖмқ„ л“ӨмқҙлҢҲ м—¬м§Җк°Җ м ҒлӢӨлҠ” лң»мқҙлӢӨ. к·ёлҹ°лҚ° н–үліөмқҳ мҲҳм№ҳлҘј кө¬мІҙм ҒмңјлЎң мёЎм •н•ҳкІҢ лҗңлӢӨл©ҙ м–ҙл–»кІҢ лҗ к№Ң. мҳҲмёЎ к°ҖлҠҘн•ң лҚ°мқҙн„°лҘј мӮ°м¶ңн•ҙ мқҙлҘј м—¬лҹ¬ н•©лҰ¬м Ғмқё кІҪм ң м •мұ…л“Өмқ„ мҲҳлҰҪн•ҳлҠ” лҚ° нҷңмҡ©н•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мғҲ мұ… вҖҳн–үліө, кІҪм ңн•ҷмқҳ нҳҒлӘ…вҖҷмқҙ мЈјмһҘн•ҳлҠ” кІғлҸ„ л°”лЎң мқҙ к°ҷмқҖ лӮҙмҡ©мқҙлӢӨ.
м ҖмһҗлҠ” лЁјм Җ 비мҡ©кіј нҺёмқөмқҙлқјлҠ” кІ°кіјм Ғ нҡЁмҡ©м—җл§Ң мҙҲм җмқ„ л§һм¶ҳ н‘ңмӨҖ кІҪм ңмқҙлЎ мқҳ н•ңкі„лҘј м§Җм Ғн•ҳкі мһҲлӢӨ. л¬ҙм—ҮліҙлӢӨ нҡЁмҡ©мқҳ мҳҲмёЎ мӢӨнҢЁ к°ҖлҠҘм„ұмқҙ лҶ’лӢӨлҠ” кІҢ л¬ём ңлӢӨ. м ҖмһҗлҠ” нҡЁмҡ©ліҙлӢӨ к°ңмқёмқҳ вҖҳмЈјкҙҖм Ғ м•Ҳл…•к°җвҖҷ(subjective well-being)мқҙ лҚ” мӨ‘мҡ”н•ң мҡ”мҶҢлқјкі ліёлӢӨ. н–үліөмқҖ мёЎм • к°ҖлҠҘн•ң кІғмқҙл©° лӮҳм•„к°Җ кё°мЎҙ кІҪм ңн•ҷм—җм„ңмқҳ нҡЁмҡ©мқ„ лҢҖмІҙн• мҲҳ мһҲлҠ” к°ңл…җмқёлҚ°, мқҙлҘј м„ӨлӘ…н•ҳкё° мң„н•ҙ м Җмһҗк°Җ нҷңмҡ©н•ң лҸ„кө¬к°Җ л°”лЎң вҖҳмЈјкҙҖм Ғ м•Ҳл…•к°җвҖҷмқҙлқјлҠ” мӢ¬лҰ¬н•ҷ мҡ©м–ҙлӢӨ. м ҖмһҗлҠ” мқҙлҘј нҶөн•ҙ лӢӨм–‘н•ң мӮ¬нҡҢ нҳ„мғҒмқ„ 분м„қн•ҳкі кё°мЎҙ кІҪм ңн•ҷм—җм„ңлҠ” м„ӨлӘ…н•ҳкё° м–ҙл Өмӣ лҚҳ кІҪм ңм Ғ н–үлҸҷл“Өмқ„ к·ңлӘ…н•ҳл Ө м• мҚјлӢӨ. н–үліө м—°кө¬к°Җ м•„м§Ғ мҷ„м „н•ң лӢЁкі„м—җ мқҙлҘё кІғмқҖ м•„лӢҲм§Җл§Ң, нҡЁмҡ©мқ„ мёЎм •н• мҲҳ м—ҶлӢӨлҠ” кё°мЎҙ кІҪм ңн•ҷмқҳ мЈјмһҘм—җ л°ҳн•ҙ вҖҳмЈјкҙҖм Ғ м•Ҳл…•к°җвҖҷмқҙлқјлҠ” 분лӘ…н•ң мёЎм •м№ҳлЎң кІҪм ңм Ғ н–үлҸҷмқҳ нҡЁмҡ©мқ„ кі„лҹүнҷ”н• мҲҳ мһҲмқҢмқ„ ліҙм—¬ мӨҖ кұҙ мӨ‘мҡ”н•ң кІ°мӢӨмқҙлӢӨ. м ҖмһҗлҠ” мқҙлҹ° л°©мӢқмқҳ н–үліө мёЎм •мқҙ к¶Ғк·№м ҒмңјлЎң кІҪм ңм Ғ н–үлҸҷмқ„ н•ҙм„қн•ҳкі кІҪм ң м •мұ…мқ„ мҲҳлҰҪн•ҳлҠ” лҚ° мӨ‘мҡ”н•ң м—ҙмҮ к°Җ лҗ мҲҳ мһҲлӢӨкі мЈјмһҘн•ңлӢӨ. к·ёлҠ” лӮҳм•„к°Җ нҳ„мһ¬ н•ң лӮҳлқјмқҳ л¶ҖлҘј нҸүк°Җн•ҳлҠ” мқјл°ҳм Ғ мІҷлҸ„мқё вҖҳкөӯлҜјмҙқмғқмӮ°вҖҷ(GNP)мқ„ лҢҖмӢ н•ҙ вҖҳкөӯлҜјмҙқн–үліөвҖҷ(GHP)мқҙлқјлҠ” к°ңл…җмқ„ лҸ„мһ…н•ҳмһҗкі м ңм•Ҳн•ңлӢӨ.
мҶҗмӣҗмІң кё°мһҗ angler@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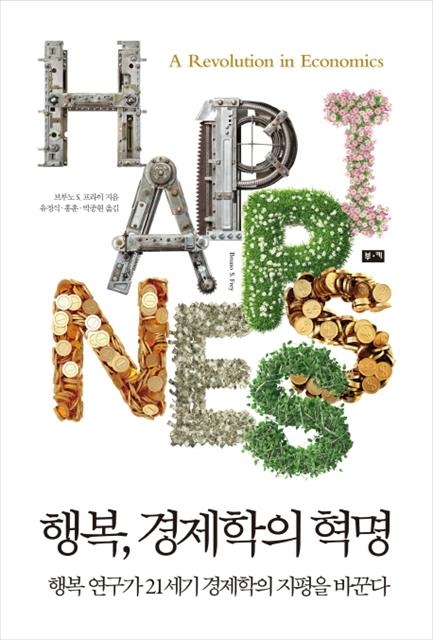
мҳҲлҘј л“Өмһҗ. лҲ„кө¬л“ мһҗмӢ мқҙ кё°лҢҖн–ҲлҚҳ кІғліҙлӢӨ лҸҲмқ„ лҚ” лІҢм–ҙл“ӨмқёлӢӨ н•ҙлҸ„ кёҲм„ё н•ҙлӢ№ мҶҢл“қ мҲҳмӨҖм—җ м Ғмқ‘н•ңлӢӨ. лҶ’мқҖ мҶҢл“қм—җ л”°лҘё нҡЁмҡ©к°җ лҳҗн•ң мӢңк°„мқҙ м§ҖлӮҳл©ҙм„ң м җм°Ё мӨ„кІҢ лҗңлӢӨ. мқҙлҘј вҖҳмқҙмҠӨн„ёлҰ° м—ӯм„ӨвҖҷ нҳ№мқҖ вҖҳн–үліөмқҳ м—ӯм„ӨвҖҷмқҙлқјкі л¶ҖлҘёлӢӨ. лҜёкөӯмқҳ кІҪмҡ° 1946л…„кіј 1991л…„ мӮ¬мқҙм—җ 1мқёлӢ№ мӢӨм§ҲмҶҢл“қмқҙ 2.5л°° мҰқк°Җн–ҲлҠ”лҚ° к°ҷмқҖ кё°к°„ лҸҷм•Ҳ н–үліө мҲҳмӨҖмқҖ нҸүк· м ҒмңјлЎң кұ°мқҳ мқјм •н–ҲлӢӨ. мқҙлҠ” кІ°лЎ лҸ„м¶ңмқ„ мң„н•ҙ н•ӯмғҒм„ұ, мҳҲмёЎ к°ҖлҠҘм„ұ л“ұ кіјн•ҷм Ғ 분м„қнӢҖмқ„ л“ӨмқҙлҢҲ м—¬м§Җк°Җ м ҒлӢӨлҠ” лң»мқҙлӢӨ. к·ёлҹ°лҚ° н–үліөмқҳ мҲҳм№ҳлҘј кө¬мІҙм ҒмңјлЎң мёЎм •н•ҳкІҢ лҗңлӢӨл©ҙ м–ҙл–»кІҢ лҗ к№Ң. мҳҲмёЎ к°ҖлҠҘн•ң лҚ°мқҙн„°лҘј мӮ°м¶ңн•ҙ мқҙлҘј м—¬лҹ¬ н•©лҰ¬м Ғмқё кІҪм ң м •мұ…л“Өмқ„ мҲҳлҰҪн•ҳлҠ” лҚ° нҷңмҡ©н• мҲҳ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мғҲ мұ… вҖҳн–үліө, кІҪм ңн•ҷмқҳ нҳҒлӘ…вҖҷмқҙ мЈјмһҘн•ҳлҠ” кІғлҸ„ л°”лЎң мқҙ к°ҷмқҖ лӮҙмҡ©мқҙлӢӨ.
м ҖмһҗлҠ” лЁјм Җ 비мҡ©кіј нҺёмқөмқҙлқјлҠ” кІ°кіјм Ғ нҡЁмҡ©м—җл§Ң мҙҲм җмқ„ л§һм¶ҳ н‘ңмӨҖ кІҪм ңмқҙлЎ мқҳ н•ңкі„лҘј м§Җм Ғн•ҳкі мһҲлӢӨ. л¬ҙм—ҮліҙлӢӨ нҡЁмҡ©мқҳ мҳҲмёЎ мӢӨнҢЁ к°ҖлҠҘм„ұмқҙ лҶ’лӢӨлҠ” кІҢ л¬ём ңлӢӨ. м ҖмһҗлҠ” нҡЁмҡ©ліҙлӢӨ к°ңмқёмқҳ вҖҳмЈјкҙҖм Ғ м•Ҳл…•к°җвҖҷ(subjective well-being)мқҙ лҚ” мӨ‘мҡ”н•ң мҡ”мҶҢлқјкі ліёлӢӨ. н–үліөмқҖ мёЎм • к°ҖлҠҘн•ң кІғмқҙл©° лӮҳм•„к°Җ кё°мЎҙ кІҪм ңн•ҷм—җм„ңмқҳ нҡЁмҡ©мқ„ лҢҖмІҙн• мҲҳ мһҲлҠ” к°ңл…җмқёлҚ°, мқҙлҘј м„ӨлӘ…н•ҳкё° мң„н•ҙ м Җмһҗк°Җ нҷңмҡ©н•ң лҸ„кө¬к°Җ л°”лЎң вҖҳмЈјкҙҖм Ғ м•Ҳл…•к°җвҖҷмқҙлқјлҠ” мӢ¬лҰ¬н•ҷ мҡ©м–ҙлӢӨ. м ҖмһҗлҠ” мқҙлҘј нҶөн•ҙ лӢӨм–‘н•ң мӮ¬нҡҢ нҳ„мғҒмқ„ 분м„қн•ҳкі кё°мЎҙ кІҪм ңн•ҷм—җм„ңлҠ” м„ӨлӘ…н•ҳкё° м–ҙл Өмӣ лҚҳ кІҪм ңм Ғ н–үлҸҷл“Өмқ„ к·ңлӘ…н•ҳл Ө м• мҚјлӢӨ. н–үліө м—°кө¬к°Җ м•„м§Ғ мҷ„м „н•ң лӢЁкі„м—җ мқҙлҘё кІғмқҖ м•„лӢҲм§Җл§Ң, нҡЁмҡ©мқ„ мёЎм •н• мҲҳ м—ҶлӢӨлҠ” кё°мЎҙ кІҪм ңн•ҷмқҳ мЈјмһҘм—җ л°ҳн•ҙ вҖҳмЈјкҙҖм Ғ м•Ҳл…•к°җвҖҷмқҙлқјлҠ” 분лӘ…н•ң мёЎм •м№ҳлЎң кІҪм ңм Ғ н–үлҸҷмқҳ нҡЁмҡ©мқ„ кі„лҹүнҷ”н• мҲҳ мһҲмқҢмқ„ ліҙм—¬ мӨҖ кұҙ мӨ‘мҡ”н•ң кІ°мӢӨмқҙлӢӨ. м ҖмһҗлҠ” мқҙлҹ° л°©мӢқмқҳ н–үліө мёЎм •мқҙ к¶Ғк·№м ҒмңјлЎң кІҪм ңм Ғ н–үлҸҷмқ„ н•ҙм„қн•ҳкі кІҪм ң м •мұ…мқ„ мҲҳлҰҪн•ҳлҠ” лҚ° мӨ‘мҡ”н•ң м—ҙмҮ к°Җ лҗ мҲҳ мһҲлӢӨкі мЈјмһҘн•ңлӢӨ. к·ёлҠ” лӮҳм•„к°Җ нҳ„мһ¬ н•ң лӮҳлқјмқҳ л¶ҖлҘј нҸүк°Җн•ҳлҠ” мқјл°ҳм Ғ мІҷлҸ„мқё вҖҳкөӯлҜјмҙқмғқмӮ°вҖҷ(GNP)мқ„ лҢҖмӢ н•ҙ вҖҳкөӯлҜјмҙқн–үліөвҖҷ(GHP)мқҙлқјлҠ” к°ңл…җмқ„ лҸ„мһ…н•ҳмһҗкі м ңм•Ҳн•ңлӢӨ.
мҶҗмӣҗмІң кё°мһҗ angler@seoul.co.kr
2015-07-18 18л©ҙ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