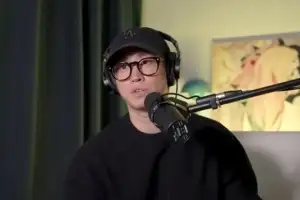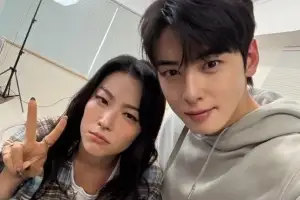“법 제정 이전 수형자에 소급적용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김모씨를 비롯한 11명이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과 부칙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들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DNA법은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0년 1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 5조는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DNA 정보는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해 삭제된다.
부칙 2조 1항은 해당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돼 수용 중인 사람도 채취 대상으로 규정했다.
2007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씨와 2002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던 안모씨 등 청구인들은 DNA 법 통과로 시료채취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교도소장이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시료를 채취하자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범행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되거나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로 채취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는 미약하고 범죄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해 크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 삭제조항 역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DNA 정보 수집·이용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며 대상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지도 않아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고 전과자 중 수용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영장주의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DNA 시료 채취는 동의에 의하도록 하되 거부할 경우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9명의 재판관 중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특정 범죄 수형인들의 DNA 시료를 획일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삭제조항과 부칙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도 밝혔다.
이정미·이진성·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삭제조항이 명백하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