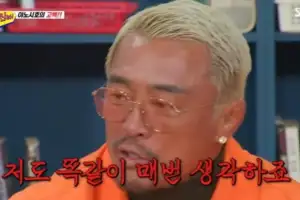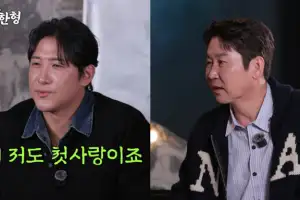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의 도영웅 조사역은 21일 ‘주요국 노동생산성 회복 지연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글로벌 위기 이전(2001∼2007년)과 이후(2008∼2014년)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시간당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위기 이전 4.6%에서 위기 이후 3.4%로 1.2%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수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3.4%에서 1.9%로 1.5%포인트나 낮아졌다.
OECD 회원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위기를 거치며 1.8%에서 0.7%로 1.1% 포인트 낮아졌고 취업자수 기준으로는 1.4%에서 0.4%로 하락했다.
도 조사역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평균을 위기 이후에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위기 위전과 비교한 하락폭은 OECD 평균을 다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폭은 시간당 기준으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취업자수 기준으로는 14번째로 크다.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은 글로벌 위기 이전에 2.1%였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2%로 0.9% 포인트 떨어졌다.
또 일본은 1.6%에서 0.7%로, 독일은 1.5%에서 0.5%로, 영국은 2.2%에서 0.1%로 각각 하락했다.
도 조사역은 “한국에서는 IT(정보통신) 산업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을 반영해 생산성 증가가 제약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잠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지원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의 도영웅 조사역은 21일 ‘주요국 노동생산성 회복 지연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글로벌 위기 이전(2001∼2007년)과 이후(2008∼2014년)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시간당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위기 이전 4.6%에서 위기 이후 3.4%로 1.2%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수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3.4%에서 1.9%로 1.5%포인트나 낮아졌다.
OECD 회원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위기를 거치며 1.8%에서 0.7%로 1.1% 포인트 낮아졌고 취업자수 기준으로는 1.4%에서 0.4%로 하락했다.
도 조사역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평균을 위기 이후에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위기 위전과 비교한 하락폭은 OECD 평균을 다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폭은 시간당 기준으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취업자수 기준으로는 14번째로 크다.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은 글로벌 위기 이전에 2.1%였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2%로 0.9% 포인트 떨어졌다.
또 일본은 1.6%에서 0.7%로, 독일은 1.5%에서 0.5%로, 영국은 2.2%에서 0.1%로 각각 하락했다.
도 조사역은 “한국에서는 IT(정보통신) 산업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을 반영해 생산성 증가가 제약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잠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지원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